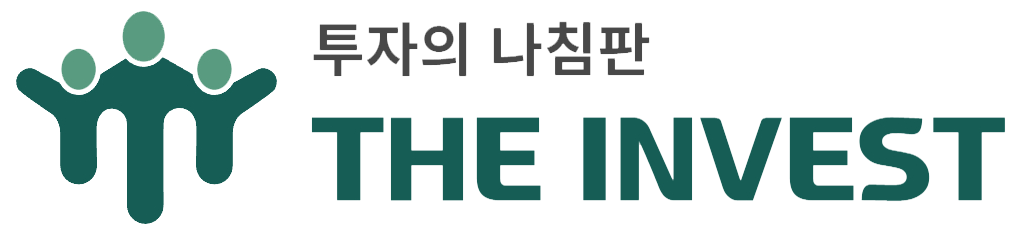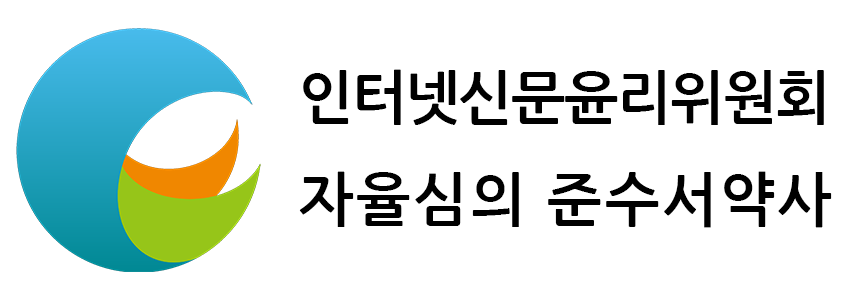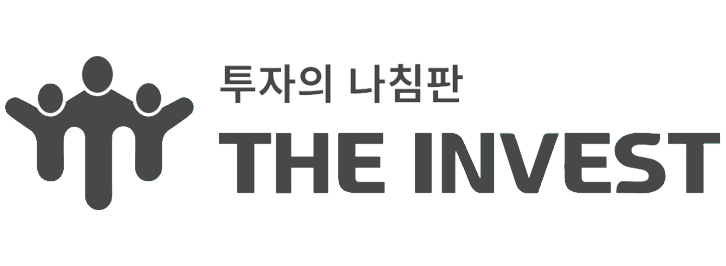도료 기업 실적, 주택과 선박 수주에 영향…수지 가격 추이도 관심
시멘트 업종, 운반·에너지·온실가스 비용에 이익률 변화
건자재의 대표 업종으로는 도료와 시멘트, 레미콘이 꼽힌다. 모두 성숙 산업으로 꼽히며 국내 시장에서 많은 기업이 참여하고 있어 경쟁이 치열하다. 또한 원재료 가격과 제품 가격 사이의 스프레드가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친다.◆ 도료 기업 실적, 주택과 선박 수주에 영향…수지 가격 추이도 관심
건설에서는 주택과 아파트의 외장 도색 수요가 존재한다. 신규 아파트와 10년을 경과한 아파트들은 외장 도색을 한다. 따라서 신규 주택 공급 물량이 늘어나고 지어진 지 오래된 아파트가 많으면 도료 수요는 증가하게 된다.
조선에서는 선박용 도료가 수주 물량과 깊게 연관된다. 한국은 선박 수주량에서 글로벌 1위 자리를 놓고 중국과 다투고 있다. 특히 최근 수요가 증가하는 LNG선박 부문에서 뛰어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선박은 수주에서 완성까지 3년 이상 걸리고 도료는 최종 단계에 투입된다. 이를 고려해서 도료 기업들의 매출액과 이익은 커지게 된다.
국내 도료시장의 규모는 4조 원 정도로 추정되며, 수요가 포화 상태인데 참여 기업이 많아 경쟁이 치열하다. 하지만 갈 수록 대기업의 시장 지배력이 커지는 추세다. 2021년 기준 도료시장 점유율은 KCC가 37.8%로 압도적이고, 다음으로 노루페인트(14.3%), 삼화페인트(11.5%)가 양강 체제를 갖췄다.
KCC의 경우 도료 사업 부문의 매출액은 전체의 25%에 불과하지만 영업이익은 40%에 육박할 정도로 이익 기여도가 매우 크다. KCC를 제외한 기업은 도료 매출액의 비중이 100%에 가깝다.
도료는 주요 원재료로 안료와 수지를 사용하며, 수지는 상장기업인 국도화학에서 주로 구입한다. 즉 국도화학의 제품 가격이 도료 기업의 원재료 가격이므로, 국도화학의 이익이 좋지 않다면 도료 기업에는 좋은 소식일 수 있다. 도료 기업을 볼 땐 국도화학의 제품 가격을 조사해보는 것이 좋다.
국도화학의 수지 가격 추이와 노루페인트의 영업이익을 비교해보면, 수지 가격과 이익이 반대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다. 수지 가격이 높을 때 노루페인트의 영업이익은 감소하고 수지 가격이 낮으면 이익이 늘어나는 셈이다. 다른 영향도 있겠지만 원재료 가격이 영업이익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시멘트 업종, 운반·에너지·온실가스 비용에 이익률 변화
시멘트는 토목 및 건축에서 모래나 돌과 같은 골재를 접착시키는 물질로, 석회석 등을 원재료로 고온의 소성로에서 생산한다. 시멘트의 원재료인 석회석과 슬래그 등을 넣고 1000도 이상으로 가열하면 클링커라 불리는 덩어리가 만들어지고, 이를 분쇄해 시멘트를 제조한다.
레미콘은 굳지 않은 콘크리트로, 모래와 자갈 등의 골재에 시멘트와 중화제 등을 섞어 제조한다. 레미콘은 굳기 전에 운반해야 하므로 먼 지역까지 이동하기 어렵다. 그래서 시멘트 제조사가 레미콘 제조까지 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시멘트 부문이 지닌 특징으로는 첫째로 성숙산업이라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거의 없고 소수 기업이 과점한 체제다. 대신 기존 사업자 간의 인수합병이 때때로 발생해 시장 점유율이 달라진다. 지난 2017년에는 시멘트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간에 세 건의 인수합병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 쌍용양회의 대한시멘트 인수, 한일시멘트의 현대시멘트 인수, 아세아시멘트의 한라시멘트 인수다. 이로써 쌍용양회와 한일시멘트, 아세아시멘트는 2021년 기준 전체 시멘트 시장의 65% 이상을 점유한 과점 체제를 형성했다.
둘째로 시멘트 주요 원재료인 석회석은 산지에 편중된 반면 시멘트 소비처인 건설현장은 대체로 대도시에 있어서 주로 철도를 통해 운반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따라서 시멘트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매출원가에 운반비가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실제 아세아시멘트는 2020년 기준 매출원가와 영업비용으로 지출된 운반비가 전체 지출의 15% 가량을 차지했다.
세 번째 특징으로는 시멘트를 생산하는 고온의 소성과 분쇄 과정에서 에너지가 많이 들어간다는 점이다. 그 과정에서 환경 유해 가스를 배출해 처리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시멘트 기업들은 에너지 절감을 위해, 일시적인 비용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폐열 발전 설비나 ESS(에너지저장장치)를 도입한다.
쌍용양회는 동해공장에 1000억 원을 투자해 폐열 발전 설비를 건설했고, 이를 가동함으로써 연간 전기료 270억 원 가량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설비 투자 비용이 일시적으로 증가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전력 비용을 아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설비를 갖춘 기업들의 수익성이 좋아지게 된다. 실제 쌍용양회의 영업이익률을 평균적으로 15% 수준을 유지하지만, 아세아시멘트와 삼표시멘트는 10% 미만대이다.
시멘트 기업들은 유해가스 배출량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을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권은 지난 2015년 1월 8600원으로 시작해, 2019년 말부터 2020년 4월까지 4만 원대로 급등했다가 2020년 10월 이후 2만 원대로 다시 하락했다. 그러나 2015년 대비 두 배 넘게 오른만큼 시멘트 기업들의 비용도 증가했다. 온실가스 배출권은 기업이 인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 비용요인이므로 시멘트 기업들의 이익률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
네 번째 특징은 시멘트 부문은 원재료와 제품의 가격 차이, 혹은 가격 변동을 이용해 투자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시멘트는 원재료의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원재료보다는 시멘트 가격 변동으로 기업의 이익을 예측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시멘트 가격은 시중에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도 어렵다.
안장섭 더넥스트뉴스 기자 jsan@thenex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