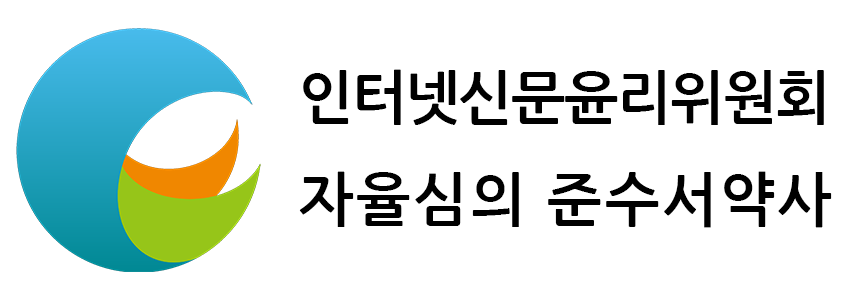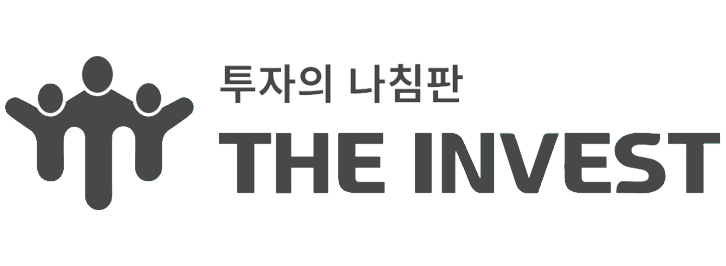한국투자증권의 공매도 규정 위반 내막이 뒤늦게 드러났다. 증권사가 수년에 걸쳐 대규모 공매도를 실행하면서 주문 표시를 해야 함에도 일반 매도인 것처럼 거래를 하다 덜미가 잡혔다.
증권사는 불야불야 ‘직원의 실수’라고 일축했지만 이를 납득하기에는 의문점이 여전하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면 주식을 빌려 판 뒤 실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주식을 상환해 차익을 내는 투자법을 말한다.
쉽게 말해 상점에서 1000원짜리 물건을 빌려 시장에 판매한 뒤, 물건 가격이 800원으로 떨어지면 똑같은 물건을 상점 주인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갚는 방식으로 200원의 차익을 보는 방식이다.
흔히 주식 가격이 지나치게 고평가 돼 있을 경우 공매도 제도를 통해 시장의 열기를 식히는 순기능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순기능에도 국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는 여전히 개인투자자들에게 포비아로 느껴진다.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가 국내 주식시장에서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크다고 입을 모은다. 반면 소위 투자업계의 전문가들은 곡학아세(曲學阿世)라며 이러한 개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여의도의 주된 의견은 공매도 역시 정상적인 범주의 거래일뿐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전문가들의 의견과 달리 돌아간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7월 코스피 시장에서 공매도 거래 비중은 전체 5%대로 올라왔다. 코스닥 역시 일 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전체거래대금 대비 1.91%까지 상승하며 비중을 키우고 있다.
7월 종가 기준 코스피 공매도 거래 중 외국인 비중은 80.24%에 달한다. 이는 6월 63.46% 수준에서 한달여 만에 80%를 훌쩍 넘어선 것이다.
같은 기간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비중은 2%에 불과했다.
그렇다면 공매도가 이 기간 소위 전문가들의 주장처럼 주식시장의 거품을 거둬 낸 순기능을 발휘한 것인가? 정답은 아니다.
공매도의 특성상 주가가 하락해야 수익을 낼 수 있기 구조 때문에 고평가된 종목의 거품을 거둬내기보다 대량물량으로 주가를 찍어 누르는 시세조종 수단으로 악용됐다.
외국인들과 기관들은 공매도를 통해 주가를 끌어 내리며 수익을 얻을 뿐만 아니라 낮아진 가격에 주식을 매수·확보하고 또 찍어누르는 것을 반복하며 1년여간의 하락장을 더 깊은 늪에 빠트렸다.
특히 수급이 무너진 국내 주식시장에서의 공매도는 기관과 외국인의 투전판으로 까지 변질됐고 불법도 서슴치 않았다.
기업이 아무리 좋은 실적을 발표해도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며 하락에 배팅하고 무자비하게 주가를 찍어 누르기르 반복했다.
설사 불법이 적발돼도 '솜방망이 처벌'로 면죄부를 받아 이익을 챙기기 일수였다.
금융당국의 대응도 문제다.
금융당국은 개미투자자들의 공매도 금지 절규에도 2년여 전과 같은 한시적 공매도 금지 대신 불법 공매도 조사전담반 설치와 같은 공매도 조사 강화로 가닥을 잡고 있다.
시장을 속절없이 무너뜨리는 공매도의 폐해에도 조사만 하겠다는 생각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달라는 요구도 헛발질만 계속하고 있다.
개인의 담보비율이 140%, 상환기간 3개월인 반면 외국인과 기관의 담보비율은 105%에 불과하다. 외국인과 기관은 상환기간이 무기한 연장돼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개인은 3달안에 물건(주식)을 갚아야 하고 물건 자체를 빌리기도 힘든 상황이지만 금융당국은 개인의 기간을 소폭 연장하는 선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달라는 목소리에 운동장의 길이만 좀 더 줄여준 꼴이다.
당국에서 공매도와 지수와의 상관성을 인지한다면 공매도의 한시적 금지 정책과 더불어 잘못된 위치조정을 서둘러야 한다.
공매도 폐지를 단순히 개인투자자의 투정쯤으로 여기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 볼 일이다. 이제 공매도에 대한 정책당국의 신중한 밑그림이 필요하다.
시장의 펀더멘털이라는 잣대를 무력화하는 플레이어들에게 레드카드를 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이치다.
이현종 더넥스트뉴스 기자 shlee4308@thenext-news.com